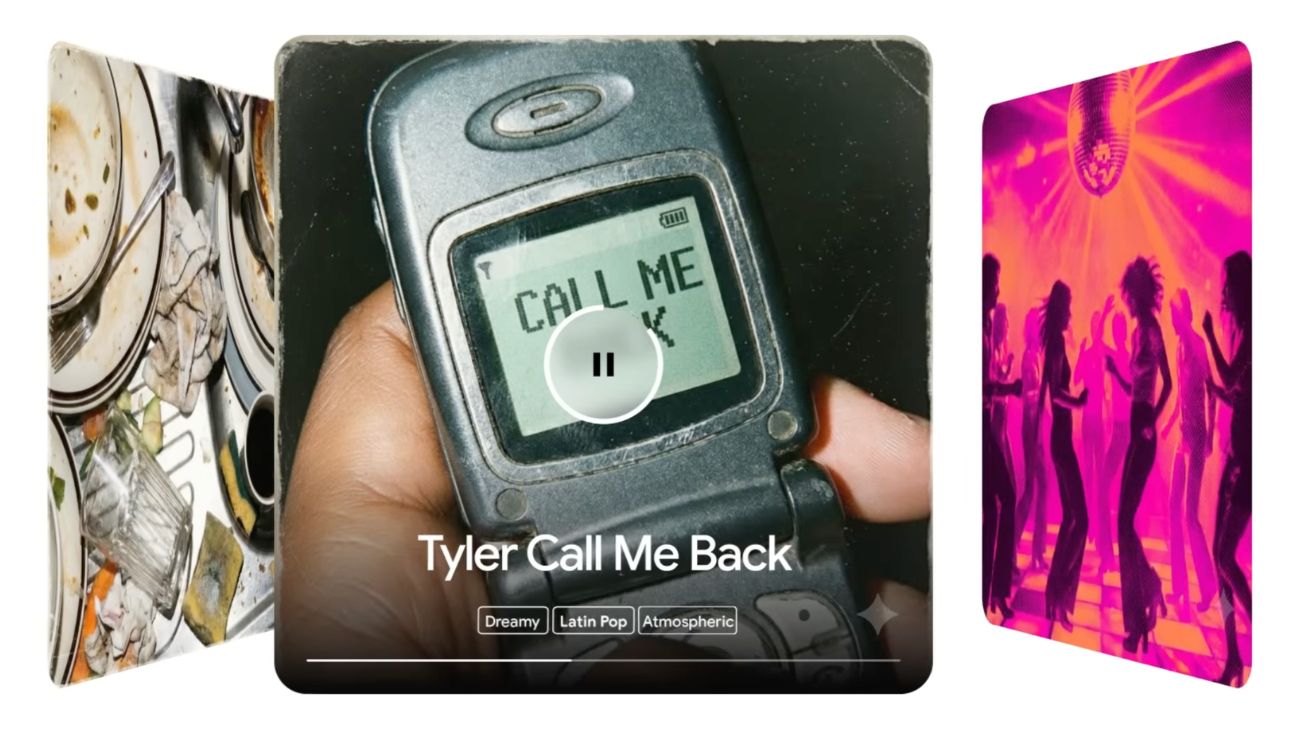국내 포털 시장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행한 ICT Brief 2024-39호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현재 55.3%를 기록하며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38.36%로 뒤를 잇고 있으며, 다음이 2.97%, MS 빙이 2.15%를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급격한 성장세다. 구글은 올해 들어 점유율이 급증하며 네이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여기에 MS의 빙까지 합치면 해외 기업들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40%대에 육박한다. 이에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을 검색엔진에 결합한 ‘Cue:(큐)’ 서비스를 선보이며 반격에 나섰다. Cue:는 한국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해 국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 검색엔진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PC 버전에서만 시범 테스트 중인 Cue:는 연내 모바일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에서는 카메라나 마이크를 활용한 이미지와 음성 처리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는 오픈AI의 ‘ChatGPT 서치’, MS의 ‘뉴 빙’, 구글의 ‘AI 오버뷰’ 등이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픈AI는 챗GPT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챗GPT 서치(ChatGPT Search)’를 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의 기술을 적용한 ‘뉴 빙(New Bing)’을 선보였으며, 구글도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를 탑재한 검색 기능 ‘AI 오버뷰(AI Overview)’를 6개국에 출시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언어모델을 검색엔진에 결합한 ‘큐(Cue:)’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AI 스타트업 뤼튼(Wrtn)은 월간 활성 사용자(MAU) 532만 명을 확보했으며, 라이너(Liner)는 AI 연구 도우미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성형 AI 검색엔진은 사용자 질문에 대해 맥락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해 답변하며, 출처까지 링크로 제공한다. 가트너(Gartner)는 생성형 AI 기술 등장으로 온라인 검색엔진 사용 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DATA INTELO에 따르면,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은 2023년 2,055억 달러에서 2032년 5,074억 달러로 연평균 11.0% 성장이 예상된다. AI 검색엔진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향상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교한 AI 모델 개발과 다국어 지원 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확보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ICT Brief 2024-39호’ 자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콘텐츠 더보기